[ad_1]
현대의학 “여성은 남근 없는 작은 존재”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 적어 명칭도 부족
‘엄마의 역사’도 소외…‘엄마 되기’ 재조명
| 21세기에도 여성의 몸만큼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화성 탐사 로버인 퍼서비어런스는 ‘붉은 행성’으로 불리는 화성의 표면에 안착, 이곳의 분화구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기물을 발견했다. 이후 NASA는 화성에 띄울 공중 탐사 장비를 보낼 계획을 밝혔다. 이곳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하기 위해서다.
예상보다 진척된 화성 탐사 연구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점은 화성 표면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더 적다는 점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여성의 아들인데도 말이다. 덕분에 인류는 아직도 여성이 자주 겪는 질염이나 생리통의 원인조차 모른다. 우리가 아는 인체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대부분 남성의 몸을 연구해 얻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6주년을 맞는다.
 |
| 여성의 자궁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기다. [게티이미지] |
“초기 해부학자들은 여성의 음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성의 음경에 훨씬 관심이 많았죠. 음경이 더 크고, 안경을 안 써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비뇨기과 전문의 헬렌 오코넬은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의학 교과서에는 여성 생식기 바깥쪽 전체를 일컫는 외음부가 지금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부위’로 해석되는 라틴어 ‘푸덴둠’(pudendum)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다수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여성에 대한 의학 연구는 생식 기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세기 고도로 발전한 과학조차 ‘아기가 들어 있지 않은 자궁’에는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 연구한 적 없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부터 여성을 “남근이 없는 작은 존재”로 분류한 지그문트 프로이트까지. 여성 질환이나 통증을 심리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사소한 ‘여자들 문제’로 경시하는 현실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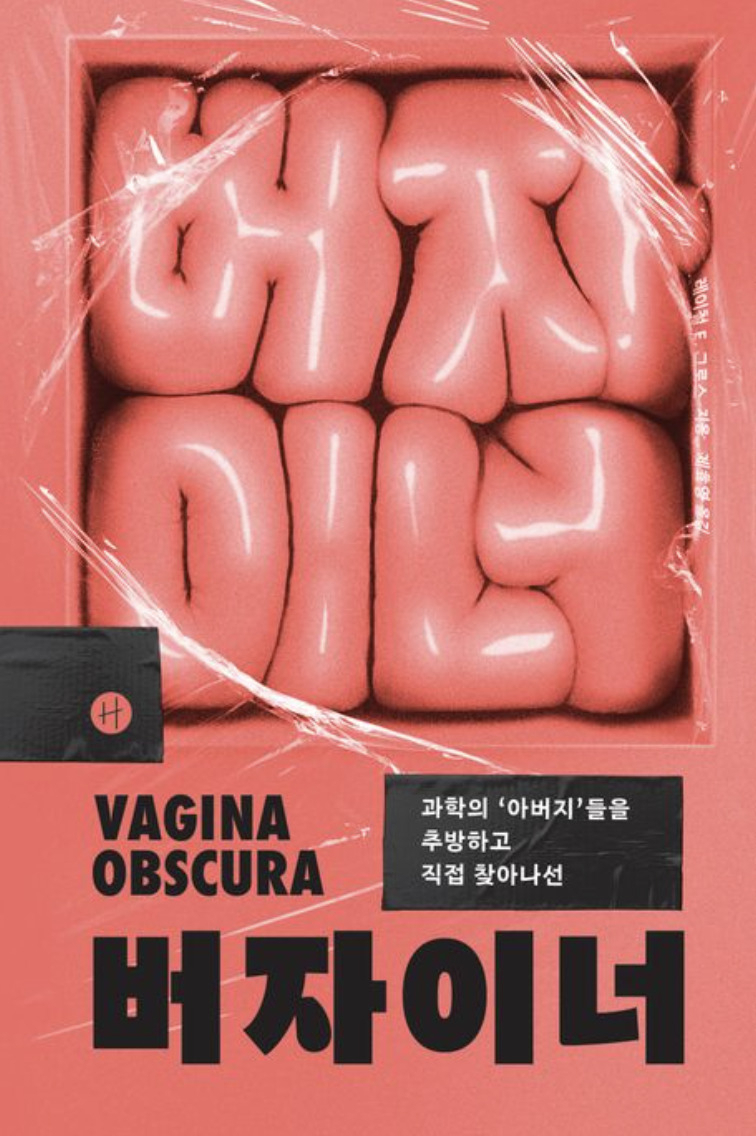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생식생물학을 전공한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 레이철 E. 그로스는 그의 신작 ‘버자이너’를 통해 의학과 학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편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저서에서 “여성의 질과 그 밖의 수많은 기관을 일컫는 적절한 용어조차 없다”며 “여성의 몸을 둘러싼 침묵과 오명, 수치심은 아직도 과학적인 탐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버자이너는 여성 생식기나 질을 뜻하는 단어다. 그나마 많이 알려진 표현이라 작가는 책 제목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조산사인 리어 해저드의 주장도 그와 궤를 같이 한다. 저자의 신작 ‘자궁 이야기’에는 인간의 다른 장기들과 같이 역동적인 신체 기관이지만, 여성의 생식기라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로 보지 못했던 자궁에 대한 섬세한 시선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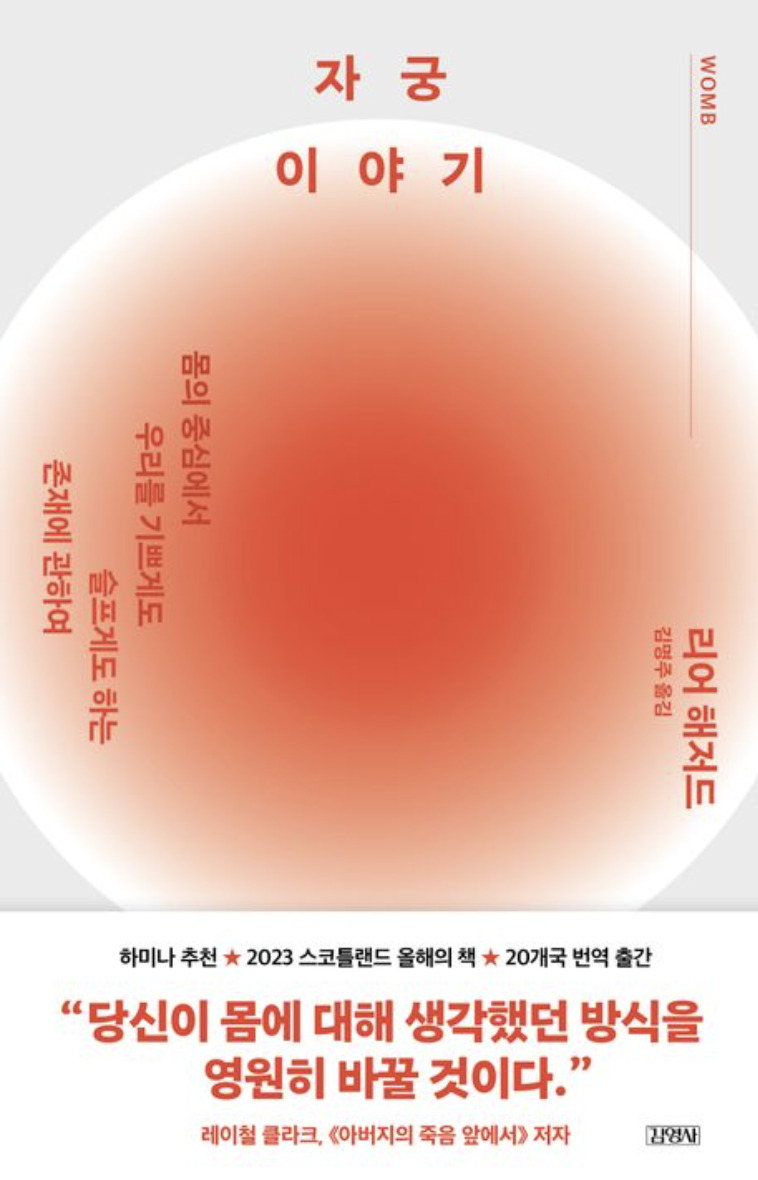
예컨대 자궁은 심장과 크기와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자궁도 내막, 근층, 외막으로 불리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6~2017년 부인과 건강 자선단체인 이브어필의 설문조사를 보면, 자궁의 부위별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젊은 여성이 허다했다. 해저드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진실에 따르면, 많은 경우 자궁은 다르게 생길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선언하며, 다소 특이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일까. 책장을 넘길수록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쌓인다. 자궁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쓰는가. 자궁이 내게 주는 것이 기쁨인가, 고통인가, 아니면 자궁을 이루는 근섬유처럼 촘촘히 짜인 복잡한 기쁨과 고통의 그물망인가. 나는 자궁이 매달마다 거치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각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여성의 몸 만큼이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제도의 바깥에 자리 잡은 문제도 있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어머니의 서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생기기 전 연구된 ‘엄마 되기’란 단지 추상적인 억측에 그칠 뿐이다.
이에 두 아이의 엄마인 역사학자 세라 놋은 17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영국과 북미 지역의 어머니를 조명했다. 그의 신간 ‘엄마의 역사’는 평범한 여성들의 잃어버린 이야기를 담아낸 역사서, 그 자체다. 수면 부족, 황급함, 기이하게 중단된 주의력, 짧은 문장들, 잠이나 젖은 옷에 대한 초조함,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 감상에 빠져드는 데 대한 불쾌감, 절박감…. 이 모든 것들이 저자의 조사 대상이 됐다. 그는 극도로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는 엄마 노릇의 흔적을 쫓았다.
“나는 어머니의 권위와 경험에 기초한 정책도, 모성주의를 보수적인 시대의 페미니즘으로 보는 것도 경계한다. (…) 명사를 동사로,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엄마 노릇 하기’라는 행동으로 바꿔보라. 전망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버자이너: 과학의 ‘아버지’들을 추방하고 직접 찾아나선/레이철 E. 그로스 지음·제효영 옮김/휴머니스트
자궁 이야기: 몸의 중심에서 우리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는 존재에 관하여/리어 해저드 지음·김명주 옮김/김영사
엄마의 역사: 우리가 몰랐던 제도 밖의 이야기/세라 놋 지음·이진욱 옮김/나무옆의자
dsun@heraldcorp.com
[ad_2]




답글 남기기